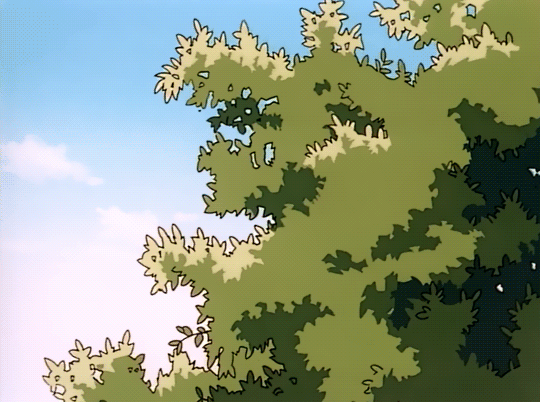
썩은 달이 지고 징그러운 아침이야, 애인아. 바람을 신으로 모신 버드나무가 미동도 않고 신을 기다리고 쓰레기봉투를 쪼던 까치는 포클레인에 앉아 꽁지를 까닥거리고 있어. 단추알만한 까치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건 그래, 벌레 같은 여름 태양이야.
난 아침이면 이런 생각을 해. 이마에서 수십 개의 뿔이 돋아도 즐겁다, 즐거워야 한다, 뭐 이런…… 안심해. 미치지 않았어. 최소한 네 앞에서는. 피곤할수록 눈동자가 살아나. 너에게서조차 위로의 속삭임이 오지 않으니 난 자주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어.
거울을 빠개는 태양. 뽑지 않아도 저절로 눈알이 녹을 거야. 태양을 떨어뜨리고 싶어. 내 머릿속에 손을 넣어줘. 물파스를 발라줘. 부탁인데 입은 좀 다물어줘. 난 열린 문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. 난 순한 것은 즐기지 않아. 자백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.
자면서도 다 듣는 애인아. 우린 썩은 이마를 맞대고 살아온 거야. 날개라고 알고 있었지만 등뒤에서 나온 건 새싹이었어. 그러니까 우린 열매였던 거지. 더 썩을 일도 없이 썩은…… 혹시 곰팡이를 키우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니? 나 아닌 누군가를?
귀에서 한 바가지씩 물이 쏟아지는 요즘은 너도 의심스러울 거야. 살아 있긴 한 건가. 우린 너무 오래 함께 있었어. 같이 있어도 혼자인 우린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게 된 거야. 우린 이제 창자를 꺼내 심어도 서로에게 뿌리 내릴 수 없어.
꿈에서라도 지붕을 뚫고 떠나. 썩은 생각만을 감싸는 두피 따위는 벌레에게나 떼어줘버려. 외로움이 길면 면도날이 없어도 스스로를 해체하는 날이 와. 그러니 애인아, 엎드려 신께 경배하자. 드디어 우린 상처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됐어. 할렐루야.
김개미, 너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 앉아
'시 & 글귀 & 대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애 (0) | 2021.06.12 |
|---|---|
| 사실은, 죽어버린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(0) | 2021.06.12 |
| 손을 마주잡을 때마다 부서지는 나를 너는 모른다 (0) | 2021.06.12 |
| 당신은 나의 괴로움을 모른다 (0) | 2021.06.10 |
|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다 (0) | 2021.06.10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