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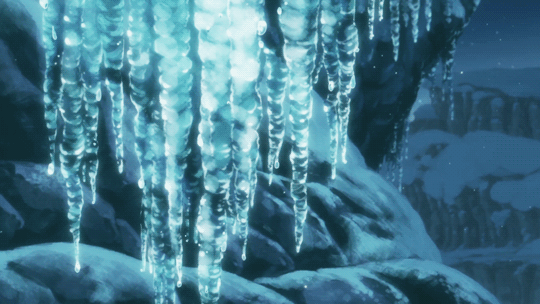
나는 정지한 세계를 사랑하려고 했다.
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세계를.
나는 자꾸 물과 멀어졌으며
매우 견고한 침묵을 갖게 되었다.
나의 내부에서
나의 끝까지를 다 볼 수 있을 때까지.
저 너머에서
조금씩 투명해지는 것들을.
그것은 꽉 쥔 주먹이라든가
텅 빈 손바닥 같은 것일까?
길고 뾰족한 고드름처럼 지상을 겨누거나
폭설처럼 모든 걸 덮을 수도 있겠지만
그것이 가위바위보는 아니다.
맹세도 아니다.
내부에 뜻밖의 계절을 만드는 나무 같은 것
오늘 아침은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하다
는 생각 같은 것
알 수 없이 변하는 물의 표면을 닮은.
조금씩 녹아가면서 누군가
아아,
겨울이구나.
희미해.
중얼거렸다.
이장욱, 얼음처럼
728x90
'시 & 글귀 & 대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이대로는 익사할 거라고 말한다 (0) | 2021.07.04 |
|---|---|
|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돌아올 텐데 (0) | 2021.07.04 |
| 검은 바다 위로 네 몸뚱이가 오르내리고 있었다 (0) | 2021.07.04 |
| 여름이 오려면 당신이 필요하다 (2) | 2021.06.16 |
|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(0) | 2021.06.15 |



